-
[5월 8일] 어버이날일상/소소한 일기 2021. 5. 9. 00:03
요새 애들
5월 7일 아빠가 당분간 할머니 댁에 계시는데 볼일이 있어 내려갔다.
할머니는 내가 오는 줄 모르셨다.
어쩐 일이냐면서 밥부터 챙기신다.
"네 아빠랑 오는 길에 먹고 왔어요. 할머니는 식사하셨어요?"
"요새 사람들은 집에서 안 먹어 다 밖에서 사 먹고 온다 밥 안 먹을래??? 금방 해줄게"
"아니에요 배불러요. 방금 먹고 왔어요."
"그래도 뭐 조금이라도 먹어....."
옆에 요양보호사님이 말을 이어가셨다.
"요새 애들은 다이어트한다고 잘 안 먹어"라며 웃으면서 말씀하셨다.
그 후 할머니께서 말을 하셨다.
"요새 애들은 (할머니) 집에서 안 먹어. 할머니네는 더럽다고 안 먹는다며 밖에서 먹고 와"'할머니네는 더럽다'라는 말을 듣고나서 무슨말인지 알 것 같아 '마음 한구석'에 못이 박힌 기분이었다.
마치 요새 애들이라는 말이 나를 대표하는 말 같이 느껴졌다.어렸을 적 나와 누나는 명절마다 할머니댁에 가다보니 크게 '위생'에 대해 신경쓰지 않았고 더럽다라고 생각자체를 안했었다.
일부 사람들이 봤을 때 시골에서의 밥상은 할머니의 말씀처럼 '더럽다'고 느껴질 수 있을 것 같다.
할머니가 말씀하시는 '요새 애들'은 우리 집에는 없지만 아마도 마을경로당에서 할머니들 사이에서 오가는 말이지 않았을까
내가 본 시골 할머니들은 대체적으로 허리가 굽어있으셨다.
그 굽은허리를 일으켜 세우면서 흙을 메꿔 그 해의 마음 하나를 만드신다.그리고 그 마음들을 채워 자식에게 준다.
본인의 끼니걱정보다 자식들의 끼니를 걱정하고
성하지 않은 몸으로 서울에 있는 자식들이 혹여나 힘들지 않은지
부족함 없는 마음이 부족하냐며 되려 물으신다.
내가 본 시골 할머니는 그랬었다.
할머니는 "요새 애들은 집에서 안 먹어"라는 말을 듣고
자신의 마음이 한 없이 부족해서, 그 마음을 채우기위해 오늘도 그 굽은허리를 일으켜 세우신다.
요새 애들2
"벌써 가는겨? 엄마 보러 가냐?"
"네 할머니 엄마한테 가요"
"엄마(며느리)가 고사리 좋아해 고사리 좀 줄게 가져가"
그러자 아빠가 말씀하신다.
"그래 가져가 엄마가 옛날부터 고사리 좋아했어
엄마는 사는 곳(외가댁)이 평지라 (산)고사리가 없어서 별로 못 먹었을 거야 엄마 (산)고사리 좋아해"요양보호사님이 말씀하신다.
"여자들은 대부분 고사리 좋아해 싫어하는 사람 없어"
그러더니 요양보호사님이 자신이 캔 고사리들을 내 짐에 넣어주신다.
나는 어쩔 줄 모르고 그 옆에서 쭈뼛대기만 했다.
헤어질 무렵 할머니가 말씀하셨다.
"손자야 돈 좀 줄까? 손자가 왔는데 용돈 좀 줘야지"
"아니에요 할머니 저 돈 벌어요. 안 주셔도 돼요 괜찮아요"
자기 방안으로 가시는 할머니를 보고 다시 말을 했다.
"할머니 진짜 괜찮아요. 저 안 받아요."
마당에서 기다리고 계신 아빠가 말씀하신다.
"아들아 그냥 받아 할머니 마음이니 감사합니다 하고 받고와"
할머니의 쌈짓돈에서 5만원을 꺼내 내 쪽으로 손을 건네며 말씀하시길
"(헷갈려서) 5만원인지 5천원인지 이젠 잘 모르겠다.
이게 5만원 맞제?
미안해하지 말고 이거 받아 나중에 돈 많이 벌어서 할머니한테 나중에 더 많이 돌려줘"그렇게 나는 주는 것 하나 없이 받기만 하고 시골집을 떠났다-

카페 오하효 어버이날
"토요일에 같이 밥 먹게 본가로와"
"응 알았어 토요일에 집으로 갈게"
"계속 집에 있을 거지?"
"아마 제주도 갈 거 같은데...?"
"누구랑 가?"
"혼자-"
"그럼 엄마 데려가"
"엄마?? 좋지... 누나는?"
"난 바빠 엄마랑 갔다 와"
그렇게 엄마와 나는 처음으로 둘이서 제주도 여행을 갔다.
원래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고 싶어서 혼자 여행을 가려 했는데 엄마와 여행을 가게 되었다.
엄마는 내심 기분이 좋으셨는지 여행내내 전화 오는 지인들에게
아들이 어버이날이라고 제주도 여행시켜주고 있다며 나를 힘껏 치켜세워주셨다
여행을 미리 생각해놓았으면 좋았을 것을 예견되지 않은 일이,
나는 '어버이 날'이라는 말아래 거짓 효도를 하는 게 아닌가 싶었다.
하지만 엄마의 행복함이 옆에서 느껴지니 잠시 지나가는 생각이었다.
엄마와의 여행은 설렘보다는 걱정이 앞서있었다.
가족여행을 할 때마다 엄마를 위해서 맞춰주는 것은 내가 아닌 누나였기 때문에,
누나가 없는 빈자리를 내가 과연 채울 수 있을까라는 부분이 마음에 걸렸다.
걱정과는 다르게 엄마와 시시콜콜한 이야기부터 '남의 이야기'들
그리고 여행 일정들이나 밥을 먹거나 구경을 하면서 시간 가는 줄 몰랐다.
내가 시간을 알아차렸을 때는 모든 일정이 끝나고 난 숙소 안이었다.
그렇게 하루가 지나가고 있다.
내가 딸노릇까지 할 수 있을까라는 걱정이 무색할 정도다.
내가 괜한 걱정을 한 것일까? 아니면 엄마가 그 만큼 알게 모르게 배려를 해준 걸까?
엄마는 여행내내 내게 딸노릇을 원했던 게 아닌 아들과의 여행을 생각하고 온 것일지도 모른다.
나는 그렇게 모른채로 여행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모를 것같다.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지금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것 하나만 알고 있다.
나처럼 엄마와의 여행을 걱정하고 있다면 일단 여행을 떠났으면 좋겠다.
자연스럽게 걱정이 사라지리라.
- 최정례시인의 빛그물 중에서...
반짝이는 것과
흘러가는 것이
한 몸이 되어 흐르는 줄은 몰랐다
당신은 죽었는데 흐르고 있고
아직 삶이 있는 나는
반짝임을 바라보며 서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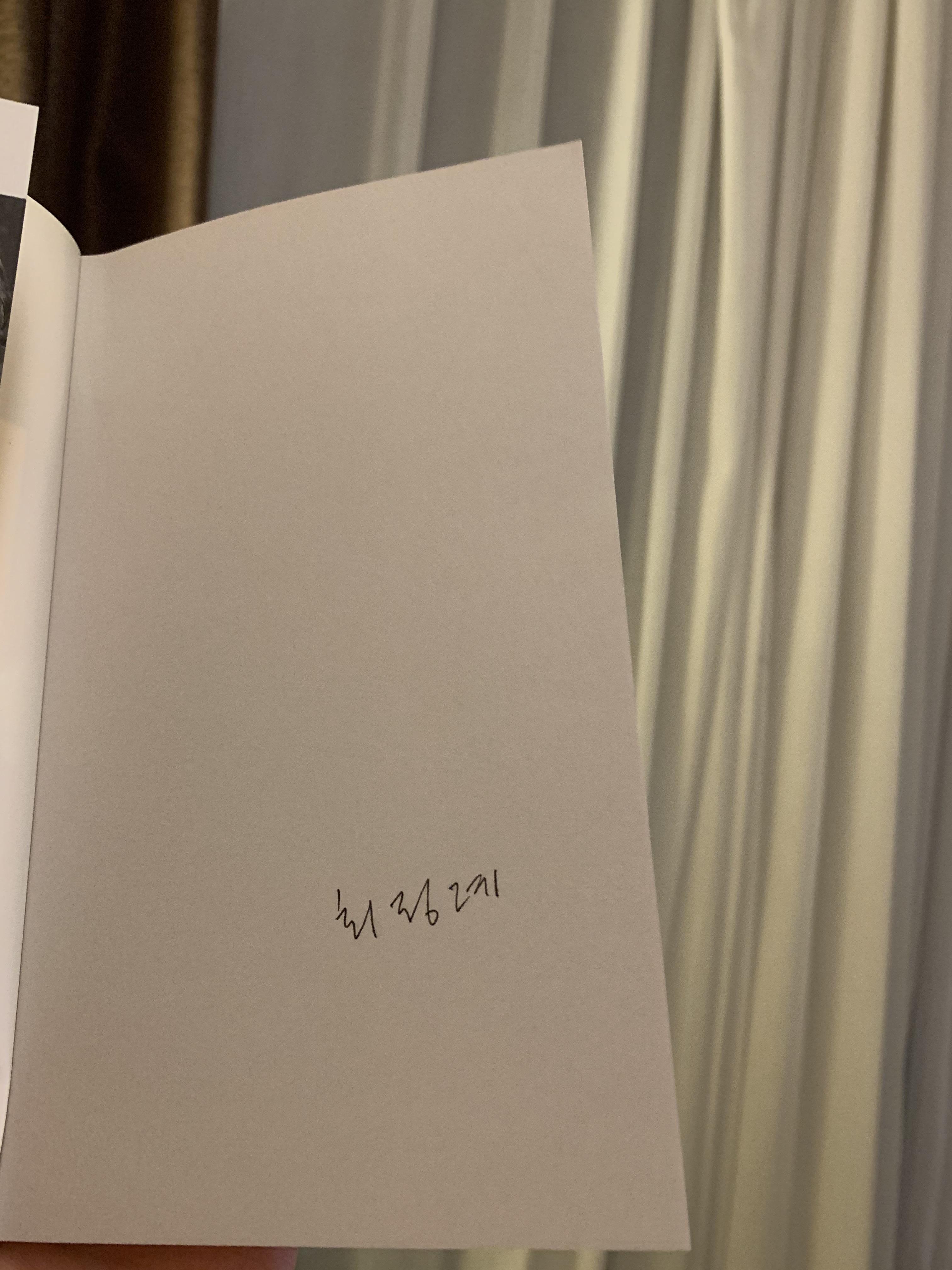
'일상 > 소소한 일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바라던 일이 뜻대로 되지 않아 상한 마음 : 실망 (0) 2021.05.04 2021년 3월 회고 (0) 2021.03.26 니트 빨래 (0) 2020.10.30